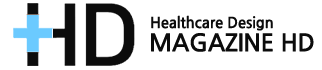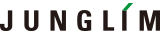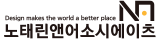-
[헬스케어트렌드 / ESG] 회복탄력의 거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병원 디자인volume.62 2025. 9. 2. 22:37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병원은 단순한 치료 시설을 넘어 재난 속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폭염, 산불,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병원이 작동을 멈출 경우, 피해는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에 따라 기후 회복탄력성을 갖춘 병원 ‘(Climate-Resilient Hospitals)’ 디자인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재난에 멈추지 않는 병원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시 공공병원 시스템(NYC Health + Hospitals)의 메트로폴리탄 병원(Metropolitan Hospital)이 있다. 이 병원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심각한 침수 피해 이후,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을 받아 병원의 기후 회복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24년 기준으로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병원 외곽을 따라 최대 높이 12피트(약 3.7m)에 이르는 방어벽을 설치해 폭풍 해일이나 홍수로부터 의료 시설을 보호한다. 또한 지하에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도시 배수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도 병원 자체적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병원은 외부 전력망이나 통신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단순한 물리적 방어뿐만 아니라 의료 기능의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크다. 더불어 방어벽 일부는 공공 예술 벽화나 벤치, 조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커뮤니티 친화적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병원을 단지 재난에 대비한 방어적 구조물로만 보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병원이 도시 내에서 마지막까지 작동해야 할 구조물이라면, 기후 변화 시대의 병원은 반드시 회복탄력성을 갖춘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너지, 물, 공기의 자립성
기후 회복탄력성 병원은 단지 재난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비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체 회복력을 높이는 설계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덴마크 Sønderjylland 지역의 Sygehus Sønderjylland 병원은 2024년, 가스 기반 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고효율 열펌프 시스템을 도입했다. 용량이 2.6 MW인 두 대의 Energy Machines™ 열펌프는 병원 내부의 냉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며, 동시에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열을 지역 난방망에 공급해 지역 사회 전체의 온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연간 약 12,500 M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15,800 MWh에 해당하는 잉여 열을 외부에 공급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이는 덴마크 평균 가정 약 740세대에 해당하는 난방량이다.
이 사례는 자연 환기나 태양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병원의 기본 기능을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회복 가능한 시설의 설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환자와 직원의 회복을 고려한 환경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가 심화되면서, 병원 외부 공간을 이동하는 것조차 환자와 의료진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Royal Darwin Hospital에서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약 50°C 이상으로 치솟았고, 이는 모두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캠퍼스 그리닝 프로젝트(Campus Greening Project)를 시작했다. 이는 병원 직원들과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한 자발적 녹화 프로그램으로, 병원 구역 곳곳에 호주 토종 식물 1,200여 주, 150종 이상을 심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인 지표면의 온도가 최대 29°C까지 낮아지고, 병원 외부는 새로운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었다. 실제로 18종 이상의 토종 새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관점에서 환자와 직원 모두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식물을 심는 것을 넘어, Larrakia족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였다. 병원은 이를 위해 지역의 전통 지식보유자와 협업해, Larrakia 문화에서 의미 있는 식물들을 직접 선별하고, 그 식물들의 이름과 전통적 사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구성했다. 이러한 공간은 원주민 환자들이 'Country'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돕고 조기 퇴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방향
오늘 날, 기후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단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가, 의료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 차원에서도 병원의 기후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의료시설 리뉴얼 및 새 병원 설계가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합적 관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은 가장 취약한 순간의 사람을 다루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병원은 언제나 작동해야 하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제 병원 디자인은 치료를 넘어, 회복을 위한 구조적·환경적 생명선이 되어야 한다.
건강과 웰빙 HEALTHCARE DESIGN,
힘찬TEAM 임나경
https://www.energymachines.com/cases/sonderjylland-hospital
https://healthcareclimateaction.org/CLI_RoyalDarwinHospital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0671525/
728x90'volume.6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진우 건축가의 '함께 떠나고 싶은 그곳'] 답사 옴니버스 4편 (0) 2025.09.03 [무각의 삶, 김마저 작가의 예술과 가구] 무각의 확장 – 조형과 삶을 잇는 실험 (0) 2025.09.03 [의사가 들려주는 병원경영 이야기]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다 • 프랑스의 아벤느 하이드로테라피 센터 (0) 2025.09.02 [편집장 FOCUS] 제1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및 2025 고령친화 정책포럼 (1) 2025.09.02 [BOOK 신간소개] 키 체인지 (0) 2025.09.02 [송창민 푸드애널리스트의 건강한 맛집] 톤제 (2) 2025.09.02 [최길수 작가의 이달의 힐링아트] 소나무 아래 행복 (0) 2025.09.02 [이수경 원장의 행복을 주는 건강 코칭] 바쁜 당신을 위한 연령별 운동 처방전 (4)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