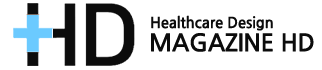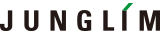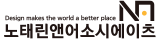-
[임진우 건축가의 '함께 떠나고 싶은 그곳']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백두산 탐방기volume.46 2024. 5. 2. 18:54

중국 연변 지역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둘러본 연변 시내는 우리 민족인 조선족자치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점마다 한글 간판이 많아 첫 방문인데도 외국 같지 않고 친근하다. 먼저 맛집으로 소문난 ‘랭면집’에 들러 입맛을 돋우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구경도 식후경이 아니겠는가. 연변에서 백두산 관광의 기점이 되는 마을인 이도백하까지는 차량으로 3.5~4시간가량 걸리는데 먼 거리 이동에 익숙한 이 곳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거리로 인식된다. 백두산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붐비는데도 관광 인프라의 수준은 한참 미흡하다. 중간휴게소는 시설이 조악하고 화장실은 부족하고 비위생적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차창 밖 풍경으로 펼쳐지는 도로 옆에는 이들의 주식량인 옥수수 밭이 지천이다. 그래도 높다란 미루나무 가로수 너머에 야트막한 산과 구릉지가 실개천과 어우러진 풍경은 70년대 쯤 개발도상국 시절의 우리네 시골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 연변 지역 
중국 연변 이도백하 가는 길 일송정과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은 항일독립운동을 노래한 가곡 '선구자'에서 익숙한 노랫말에 등장하는데 용정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다. 하지만 조선의 민족정신을 고양한다는 이유로 죄 없는 일송정은 일제에 고사당하는 비운을 맞아 온데간데없다. 다만 평범한 소나무 한 그루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서서 힘이 없던 조국의 서글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증인처럼 알려주고 있다.

중국 연변 윤동주 생가 중간쯤에 명동촌이라는 마을에 윤동주 생가가 있어 들러 갈 수 있다. 보행자 진입을 위한 길 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의 시들이 여러 돌판에 새겨져 비석처럼 도열해 있다. 그 돌들은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고통 받다가 교도소에서 순국한 천재 시인, 윤동주의 묘비처럼 느껴져 처연하다. 1900년 경 그의 조부가 지었다는 검박한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한낮의 햇볕 속에서 시간을 잊은 채 그의 유년 시절을 상상해 본다. 주변의 풍광은 하늘과 바람과 별이 가득한 곳으로 그의 시어처럼 평화롭고 한적하다.

백두산 이도백하에 도착한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백두산을 향한다. 우리 일행은 북파 코스를 선택했고 차를 몇 번 갈아타야 천문봉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오호 통재라, 오늘따라 하필 날씨가 따라주지 않아 정상에 오를수록 짙은 안개도 모자라 비까지 내린다. 백 번 와야 두 번 정도 잘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백두산이라는 농담으로 안내자는 허탈해진 우리 일행을 위로한다. 천지연의 모습은 안개 속 신비에 쌓여있고 초행객들에게 명산은 자신의 자태를 보여주는 것에 인색한지, 허락하지 않는다. 우비를 입었지만 옷은 비에 젖고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는 뚝 떨어진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휴게실에는 다행히 한국산 컵라면이 있어 따뜻한 국물로 추위를 녹이고 허기와 아쉬움을 달래본다. 역시 해외에서 컵라면의 효용은 위대하다.

중국 장백폭포 가는 길 
중국 장백폭포 가는 길 장백폭포라도 보아야 하겠기에 발길을 돌려 하산하는 동안 다행히도 비는 그쳤다. 중첩된 산등성이마다 습기가 가득하고 낮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기도 하다. 인근에는 천연 온천수가 나오는 곳도 있어 매캐한 유황 냄새가 수증기와 함께 피어오르니 태곳적 풍경과도 흡사하다. 폭포를 보기 위해 입구부터 우비 옷 차림의 관광객들이 일렬로 길게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이 구도를 위한 순례자의 거룩한 행렬처럼 인상적이다. 다만 무채색 계열의 자연과 선명한 색상의 알록달록한 군상들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시선에 잡힌다. 숨 가쁜 호흡으로 마지막 가파른 계단을 올라 폭포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초현실적인 수직 물줄기의 풍광 때문에 가슴속에 느낌표가 날아온다. 폭포의 상부는 운무가 형성되어 있어 마치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듯 보이는 약 60m의 웅장한 낙수는 장엄한 대서사시처럼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룡폭포라는 별명처럼 운무 속에서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하다. 이 용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존재했고 앞으로도 긴 세월을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감동은 가슴으로 전달되어 전율하게 한다.

중국 장백폭포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을 중국지역에서 올라가야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는 제대로 보지 못한 백두산을 결단코 우리 땅을 밟고서 보게 될 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만 아니라 중화 10대 명산으로 세계 속에 전파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지금 당장은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도 백두산의 이름을 찾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백두산 천지

글/그림. 임진우 (건축가 / 정림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728x90
728x90'volume.46'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행인의 글 (0) 2024.05.03 [SPECIAL COLUMN] 닫힌 세계에 빛과 문화가 스며든 헬스케어 문화공간 (0) 2024.05.02 [함혜리의 힐링여행]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0) 2024.05.02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의료계 발전에 힘써온 노만희 원장 (하) (0) 2024.05.02 42년째 환자의 마음 읽기에 충실한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 (0) 2024.05.02 [의사가 들려주는 병원경영 이야기] 차별화 하거나 아님 죽거나 (0) 2024.05.02 [양재혁의 바이오Talk 헬스Talk] 일본 모리노카제 · 우에하라 방문기 (0) 2024.05.02 [헬스케어 트렌드] 웨어러블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갤럭시링’ (0)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