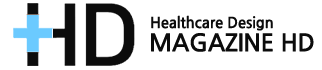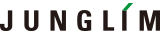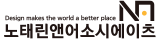-
[이현주 병원 마케터가 바라본 짧고 얕은 문화이야기] 흰색 실을 엮어서 죽음과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다volume.26 2022. 9. 1. 19:55
시오타치하루 전시 <In Memory>를 다녀와서
흰색 실을 엮어서 죽음과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다.미니멀 라이프라기보다는 정리에 한동안 꽂힌 적이 있었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잘 정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데 짐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시기 정리 관련 책들을 찾아 읽으면서 정리는 현재 주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싶어서였다. 정리를 하기 싫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우선순위에서 정리가 밀리는 것도 알게 되었기에, 정리를 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찰부터 있었던 거 같다.
그러다가 TV에서 정리 프로그램인 <신박한 정리>가 나왔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은 안 봐도 그건 꼭 챙겨보고 비포 에프터를 비교하며 감탄하기도 했다.
아무튼 한동안 이렇게 정리에 꽂혀 집안 정리에 열을 올리다 보니 정리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흩어져 있던 물품들을 모아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정리 방식에서도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다.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물품들을 정리할 때였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스스로와 타협해서 정리했지만 차마 정리하지 못하고 박스 속으로 다시 넣어둔 것도 꽤 되었다.
그렇다.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조각조각 보여주는 것이니까.
실타래 안에 유품을 넣어 영원성을 담은 작품으로
시오타치하루의 전시회를 얼마 전에 다녀왔다. 2년 전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Between us> 전시와 그 해 휴가 차 방문했던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만난 <Living Inside 2020>에 이어 2년 만에 만난 그의 전시였다. 이번 전시회는 <In Memory>였다.

living inside, 2020 
Between us, 2020 2년 전 전시에서는 빨간 색실 하나로 화이트 큐브를 덮어 버렸는데, 그 공간이 주는 압도감에 그 당시에도 전율이 일었다.
이번 전시회는 제목처럼 그의 작품 속에 기억을 품은 물건들이 있었다. 실로 촘촘히 엮은 그 공간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사진첩, 편지, 카드, 엽서, 악보, 권총 등 다양하다. 이 물건들은 작가가 거주하는 독일 베를린의 벼룩시장에서 수집한 것들. 독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청소업체가 망자의 물건을 판매하는데 거기서 구매한 물건들이라고. 즉, 그렇게 유품으로 작품을 만듦으로 그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추억에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성을 담아 각인시킨 것이다. 사용하던 사람이 없어져 존재가치가 없어진 그 물건의 기억을 작가가 작품으로 만들어 또 다른 상상과 기억으로 연결시켰다.

State of Being (Boxe), 2022 
State of Being (Book), 2022 
State of Being (Gun and Money), 2022 
State of Being (Window, Letter), 2022 개인적으로 마주했던 죽음의 경험을 작품에 반영해
기억.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비슷한 삶 속에서 떠오르는 찰나의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다. 나에게는 어떤 또렷한 날이 있을까. 신문사에서 잡지사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이 잡지 마감일이었다. 옮긴 지 얼마 안 되었고, 내 원고들을 끝내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국 원고 마감을 치느라 마지막 날 장지로 바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면서 차 안에서 꺼이꺼이 서럽게 울었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첫째가 태어날 때이다. 잡지사 편집장을 할 때였는데, 진통이 왔는데도 그날이 잡지 마감일이라 밑의 후배 기자들과 통화하면서 지시하다가 다시 진통으로 소리 지르고 다시 일하기를 반복했다. 지나고 나니 왜 그렇게 일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일이 잘 안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무지했던 시기였다. 어찌 되었던 그렇게 첫째가 태어난 날은 생생하게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난다.
삶에서 강하게 각인된 날을 돌이켜보니 만남인 삶과 헤어짐인 죽음이 가장 컸고, 그 밖의 만남과 헤어짐 들도 촘촘히 기억의 틀에 박혀있었다.
시오타치하루의 작품들도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릴 적 할머니의 무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 두 번의 암을 진단받으면서 느꼈던 가까워진 죽음 등. 죽음을 마주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삶을 강하게 느낀다.
이번 전시에서는 흰색 실로 가득한 공간을 만날 수 있었다. 물론 2년 전 공식 전시에서는 빨간색 실로 엮어진 공간을 만났다면, 이번 전시는 흰색 실이다.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만났던 작품도 흰색이었지만, 이번 전시에서의 흰색에 작가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in memory, 2022 
in memory, 2022 
in memory, 2022 한강 소설 ‘흰’을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In Memory>
바로 맨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소설 ‘흰’을 읽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전시를 보고 와서 이 소설을 찾아 읽었다. 사실 한강의 책은 편하게 읽기 쉽지 않아 마음먹고 책을 펼치게 된다. 이 책도 이번 전시가 아니었다면 아마 안 읽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이 소설책 ‘흰’은 에세이 같기도 시 같기도 한 낯선 형태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책 속 화자에 감정 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강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확장해서 이건 소설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든다. 강보, 배내옷, 달떡, 안개, 눈, 파도, 서리 등 65개의 단어를 통해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설 속 흰색은 죽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죽음을 덮는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기도 하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 소설 <흰> 中에서
한강의 실제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시골이고 전화기도 집에 없던 시절, 퇴근하고 남편이 오려면 한참 남은 시간에 아직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아닌데 진통을 느낀 어린 엄마가 진통을 참아가며 배내옷을 어설프게 만들고, 어른들에게 들었던 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탯줄을 자르고 피 묻은 몸에 배내옷을 입히고 옆에 뉘어 아이를 안는다. 그때 엄마는 죽지 마, 죽지 마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한다. 한 시간 뒤 눈을 열어 엄마와 까만 눈을 맞춘 아이는 그리고 한 시간 뒤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모로 누워 아이의 몸이 점점 싸늘해질 때까지 엄마는 그렇게 견뎠고,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젊은 엄마가 혼자 겪은 아이와의 이별, 그리고 다시 둘째도 유산을 하고, 그들을 대신해 셋째와 넷째가 그 자리에 있다고 표현한다. 그렇게 죽음은 누군가의 시작인 삶과 연결고리를 하고 있었다. ‘흰’은 모든 색이 다 들어 있는 근본적인 색이기도 하고, 어떤 것을 그리기 전의 흰 캠퍼스를 떠올리게도 한다. 뿌연 안개 같은 미지의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흰’이 그렇게 삶과 죽음의 공존을 표현하면서 삶의 기록에 대해 썼던 것처럼 이 시오타치하루의 작품도 그랬다.
시오타치하루 전시장에 느꼈던 감정과 소설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느낀 감정이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 놀랍도록 신기했다.

in memory, 2022 
in memory, 2022 흰색의 실로 만들어진 설치미술 중간에는 배가 떠있고, 그 위에 흰 원피스 세 개도 떠있다. 드레스는 제2의 피부,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배는 그들의 기억을 담아 항해하는 미지의 여행을 표현하는 것도 같고, 모호한 끝을 알 수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알 수 없는 삶을 표현한 거 같기도 하다. 천장의 실타래 속에 켜켜이 채워져 있는 흰색의 종이들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누군가에는 힘듦을 표현한 일기이자 메모일 수도 있다.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있는 기억(memory) 일 것이다.
그녀가 던진 화두.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개가 되는 기억…
그의 작품에서 흰색 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작품에서 빨간 실은 사람의 인연, 검정 실은 칠흑의 우주를 표현했는데, 색깔을 떠나 그가 사용한 색은 모두 인간의 존재로 연결해 두었다. 예전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주인공 남녀의 손가락에 빨간색 실이 연결되어 있던 것도 기억나는데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을 그렇게 묘사해서 더 인상적이었다. 빨간 실이 한편으로 미세혈관처럼 느껴지는 작품들도 참고로 꽤 볼 수 있다.


Endless Line, 2022-2 
Cell, 2022 
Second Skin, 2014 
Connected to the Universe, 2022 얽히고 엉킨 실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도 하고 더 심하게 엉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런 듯하다. ‘실을 엮는 작가’인 시오타 치하루는 캔버스 위에서도 붓을 들지 않고 실로 작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매개가 되는 기억에 대해.
시오타치하루의 설치미술은 작품을 설치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진다고 한다.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기에 새로움에 대한 설렘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상실을 딛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
더불어 아직 한강 소설 ‘흰’을 읽지 않았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생각해보니 나는 바다를 좋아했지만 파도의 끝자락에서 으스러지는 흰색을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는 또 다른단어 속의 흰색을 좋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
글/사진. 이현주 병원 마케터

이현주
글쓴이 이현주는 바른세상병원에서 홍보마케팅 총괄을 하고 있는 병원 마케터이다.병원 홍보에 진심이긴 하지만, 한 때 서점 주인이 꿈이기도 했던 글쓴이는 독서와 예술에 관심이 많다.
728x90'volume.26'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감한 투자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먼저! (하) (1) 2022.10.07 서초 김연진의 퓨린피부과의원 (0) 2022.09.05 [유은정 원장의 심리처방]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한 거야 (0) 2022.09.05 [인천가톨릭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디자인과] 테크 기업의 서비스 디자인 (0) 2022.09.02 웨이하이 전통 한방병원 (0) 2022.09.01 [임진우 건축가의 '함께 떠나고 싶은 그곳'] 이탈리아 여행 1 - 남부에서 중부까지 (0) 2022.08.31 [마태호 원장의 책 해방일지] 체크! 체크리스트 (0) 2022.08.31 [이수경 원장의 행복을 주는 건강 코칭] 몸을 불편하게 하라 (0)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