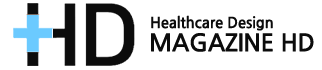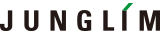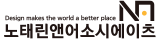-
[2022년을 맞이하며] 잠잠함 속엔 거대함이 숨어 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2. 1. 15:26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글을 쓰자니 제목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집에 있게 했다. 어릴 적에는 치안을 명목삼아 12시 통행금지가 있었다.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남의 집 대문 앞에라도 서서 몸을 웅크렸다. 여대생이던 나는 기숙사 점호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숙사 뒷길로 뛰어올라가다 문 앞에서 사감 선생님과 마주친 적도 있었다. 물론 점호를 마치면 여대생 기숙사만의 특권을 누리며 오손도손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선후배 언니들, 혹은 친구방에 마실을 가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스템 하에 다시 10시면 식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게 일상이 되었고, 거리는 어릴 적 통행금지 시절처럼 잠잠하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팬데믹 이전의 밤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하거나 좋아하는 동네 술집, 와인 바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는데….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과거와 지금의 제도에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퇴보라고 볼 수 없다. 통행금지령은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과 질병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 시절 통제 속엔 그래도 집에 머물러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거나 티브이 앞에 머물러 얼굴을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의 통제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집에 들어와도 각방에 들어가 폰으로 다른 세상을 본다. 소통 없는 가족들보단 온라인 세상 속 유튜버를 보며 동경하고, SNS속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들 조용히 다른 공간 속에 사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과 뜻을 맞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너무나 개인의 취향을 잘 맞춰주는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 계속 나에게 보라고 권해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편안함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속하게 된다.
조용한 세상 속 거대함이란 그런 것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유형에 맞춰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를 우리의 세상으로….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더 영리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들을 각자의 고집과 개성에 맞춰 더 단단해지도록 교육시키고 지배하려 든다는 것이다.
어느덧 코로나 19와 함께한지도 2년이 지나갔다. 특히 올해 중반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위드 코로나로 변화하는 중이다. 물론 마스크와 함께이겠지만 다시 사람들은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조용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거대함에 녹아들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습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시 개방된 일상에 맞춰 깨어날 준비를 할 것이다.

글. 노태린 매거진HD 발행인, 노태린어소시에이츠 대표
728x90